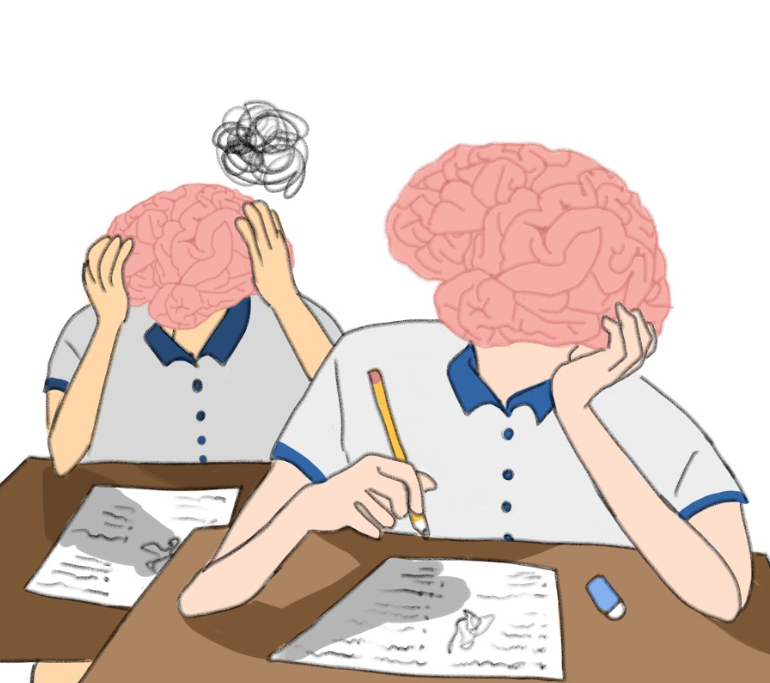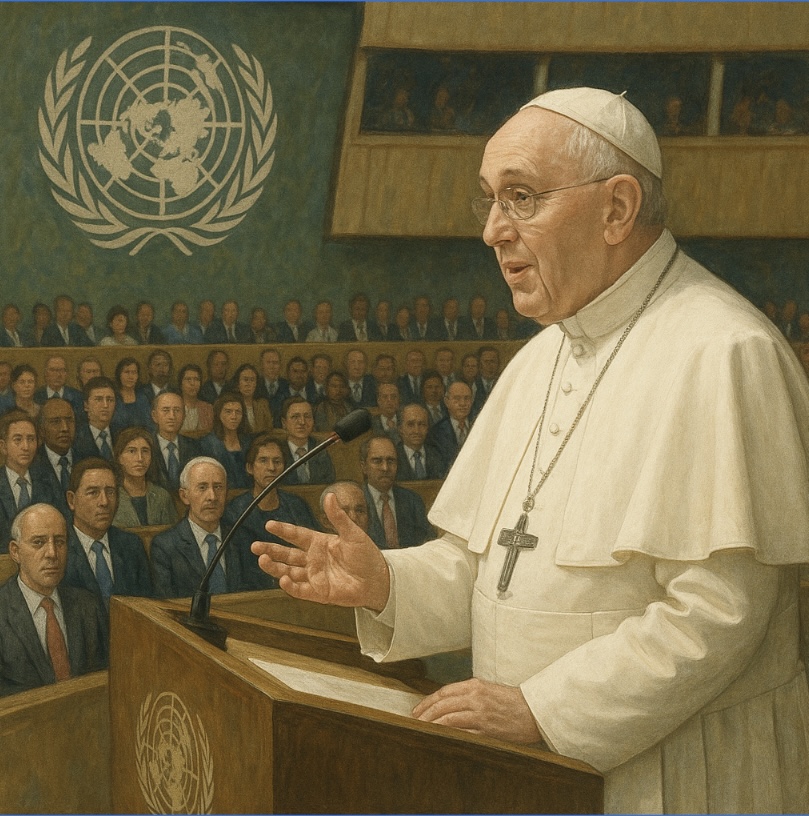<Illustration by Serin Yeo 2008(여세린) >
IQ와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
[객원 에디터 9기 / 신하은 기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능’은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에 부딪쳤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고 처리 방법을 알아내는 지적 활동의 능력, 또는 지혜와 재능”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지능의 정도를 ‘성적’이라는 지표로 판단하곤 한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흔히 ‘똑똑하다’라고 평가되고,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덜 똑똑하다’는 인식을 받기 쉽다. 과연 성적은 지능의 올바른 척도일까?
지능지수(IQ)는 추상적 사고력, 기억력, 문제 해결력 등 다양한 인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지능을 수치화한 표준화된 척도이다. IQ라는 개념은 20세기 초 알프레드 비네(Alfred Binet)가 지능 검사를 개발하면서 처음 등장하였고, 이후 루이스 터먼(Lewis Terman)에 의해 스탠퍼드-비네 지능 척도(Stanford-Binet Intelligence Scale)로 개량되었다.
지능은 낯선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반면, 성적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정확히 해결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이처럼 지능과 성적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지만, 두 요소 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IQ와 학업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연구팀은 IQ와 학업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가 약 0.50 정도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IQ가 학업 성취도의 약 25%를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대학입학시험인 SAT 점수와 일반 지능(g factor) 간의 상관관계는 0.82, 영국의 GCSE 점수와는 0.81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IQ는 표준화된 시험 성적과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학업 성취도를 예측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상관관계가 곧 성적이 지능의 전부를 평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IQ는 추상적 사고력과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인지 능력 척도일 뿐이며, 지능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지 않는다. 실제로 학업 성취에는 학습 동기, 정서적 안정성, 학습 환경, 교사의 질, 가정 배경 등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IQ는 하나의 유용한 지표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개인의 지능이나 잠재력을 온전히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에는 ‘시험’이라는 제한된 틀 안에서 학생들의 능력이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은 시험 성적을 자신의 지능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여기며, 성적이 낮을 경우 자신의 능력 전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지능은 시험지 안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삶 속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이를 해결하려는 사고력과 창의성,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등이야말로 진정한 지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성적은 현재의 학습 습관과 노력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일 수는 있지만, 결코 개인의 지적 능력 전체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따라서 성적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사고하는 힘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