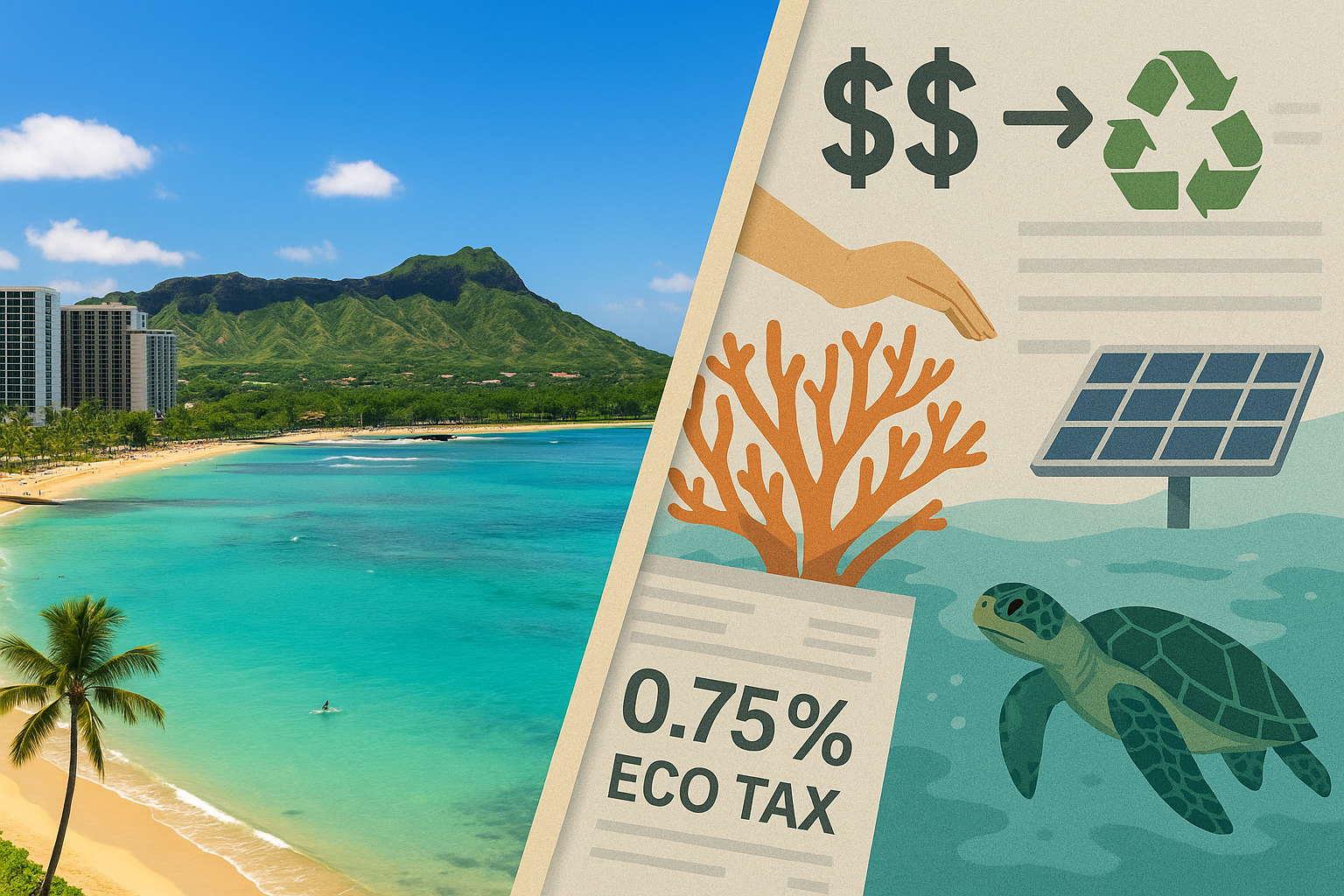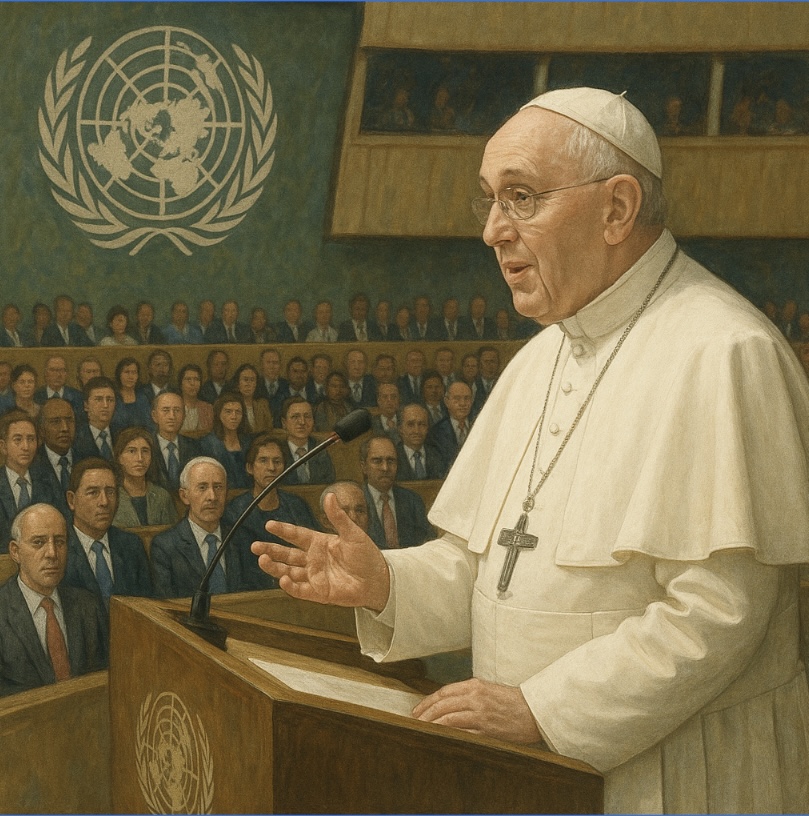[객원 에디터 8기 / 우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국부펀드를 신설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국부펀드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외환보유액을 보유한 국가나, 석유 등의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한 나라에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를 떠안고 있어, 국부펀드 설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부터 국부펀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심지어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이를 고려한 적이 있어, 미국 국부펀드 창설은 초당적인 관심을 끄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이 국부펀드를 보유하지 않은 이유도 명확하다.
미국에는 이미 알래스카 영구 기금과 같은 일부 주 단위의 국부펀드가 존재하지만, 연방 차원의 국부펀드는 운영되지 않았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는 월스트리트 중심의 거대한 민간 투자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미국 정부가 국부펀드를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민간 투자가 충분히 활발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90일 내에 국부펀드 설립 계획을 구체화하고, 12개월 내에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펀드는 인프라 건설, 제조업 설비, 의료 연구 등 국가적 프로젝트의 자금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틱톡 지분 인수 방안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국부펀드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 목표 금액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2024년 대선 당시 2조 달러 혹은 그 이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36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재정 흑자는 요원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한 것처럼, 관세 정책이 경제 협상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국부펀드를 설립하려면 현금이 필요하지만, 현재 연방정부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자산을 현금화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연방정부 대차대조표에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국부펀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포트 녹스에 보관된 금을 매각하거나, 연방정부 소유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들 또한 한계가 있으며, 국부펀드 운영에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국부펀드 신설을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의회가 이를 쉽게 통과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국부펀드가 자칫 정치적인 목적이나 특정 이해관계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개발센터(CGD)는 보고서를 통해 국부펀드가 정치인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경고하며, 관세 수입을 별도로 펀드에 배정하면 예산 운용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국이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자산 규모는 약 10조 달러에 이른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1조 8000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크고, 중국과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1조 3000억 달러, 1조 1000억 달러 규모로 뒤를 잇고 있다. 대부분의 국부펀드는 국가의 외환보유액이나 자원 수익을 기반으로 조성되었으며, 장기적인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외환보유액이 많지 않고, 천연자원 수익도 주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국부펀드와 운영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이 국부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국부펀드가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국제적인 경제 전략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