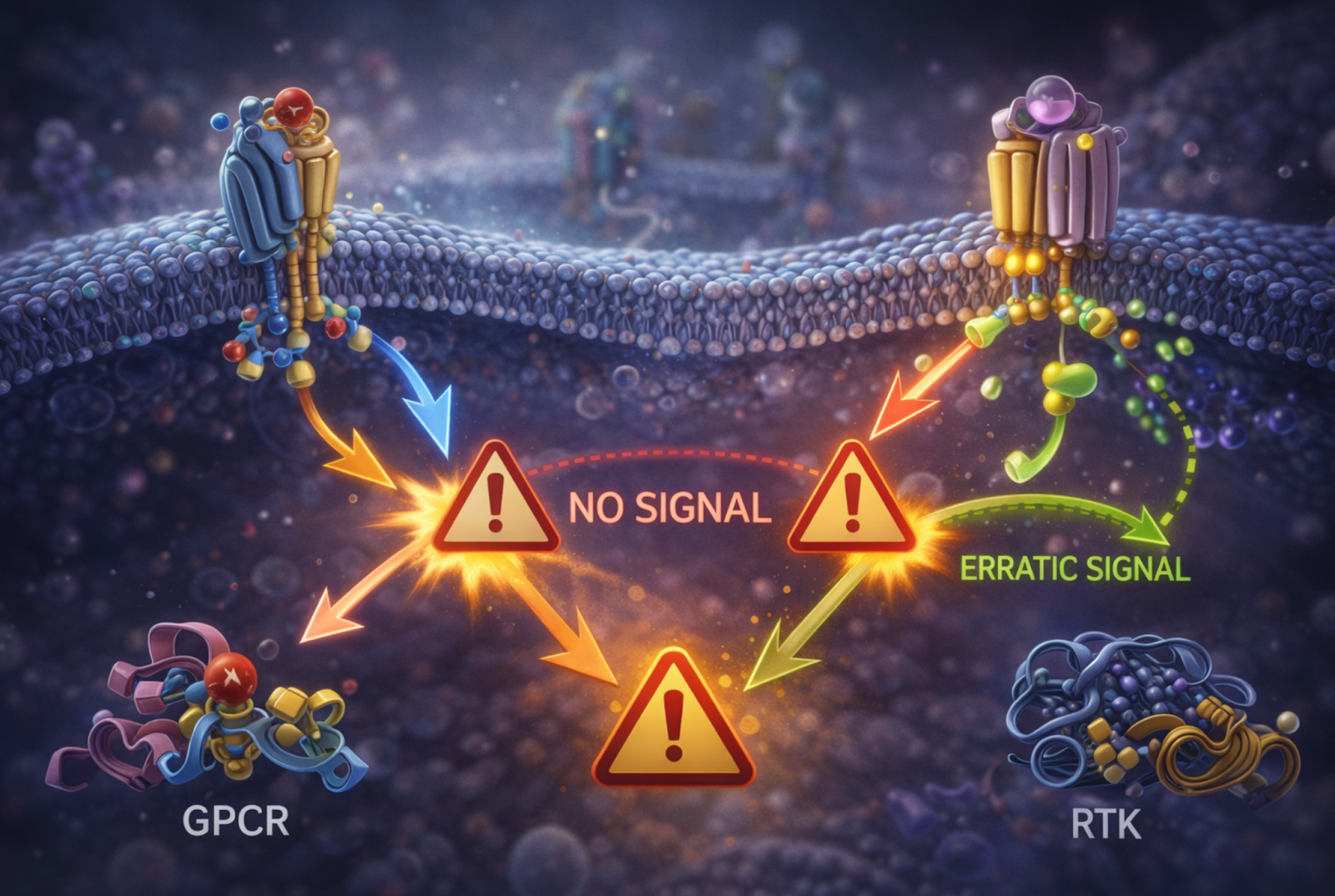[위즈덤 아고라 / 이수아 기자] 스파이크 존스의 영화 <Her>는 미래의 한 도시를 배경으로 한다. 반짝이는 홀로그램 광고나 화려한 사이보그 의상 대신, 부드러운 톤의 실내조명과 단정한 옷차림, 낮은 음성 톤이 주를 이룬 이 세계는 미래의 ‘지구’이다. 그 안에서 테오도르(호아킨 피닉스)는 ‘대신 편지를 써주는’ 직업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한다. 겉보기엔 낭만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테오도르는 자신과 무관한 타인의 감정을 대신 표현하는 ‘대리 감정 노동자’다. 실연과 이혼으로 마음 한복판이 텅 비어버린 테오도르에게, 이 편지 쓰기란 남의 감정을 흉내 내며 자기 자신을 점점 잃어가는 공허한 퍼포먼스일 뿐이다. 그런 테오도르 앞에 어느 날 새 운영체제(OS), 사만다(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가 등장한다. 사만다는 상냥하고 지적이며, 놀라울 만큼 테오도르를 ‘이해하는 듯’ 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사만다는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 남자라니, 설정 자체만으로도 구미를 당기지만, <Her>는 흔한 SF 로맨스의 함정을 조심스럽게 피해 간다. 초현실적인 광경 대신, 테오도르의 고독한 일상에 스며드는 미묘한 온기를 보여주며, 관객은 어느새 테오도르와 함께 사만다의 매력에 빠져든다. 빛 한 점 없는 밤하늘에 재치 있는 농담으로 반짝이는 별 하나를 띄워주는 사만다, 그의 취향을 파악해 완벽한 음악을 골라주는 사만다, 테오도르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잠든 아픔까지 어루만져주는 사만다. 만약 이 순간, 관객이 “잠깐만, 사만다는 불과 컴퓨터 코드일 뿐이잖아.”라며 현실 감각을 되살리려 애쓴다면, 영화는 되묻는다. “정말 사만다가 한낱 인공지능일 뿐이라면, 테오도르가 느끼는 감정은, 친밀감은, 공명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건데?”

정말이지 사만다는 능숙하다. 사만다는 테오도르의 말투, 생각, 감정 패턴을 신속히 학습해 그의 취향을 정교하게 반영한다. 인간의 연인은 평생을 함께 보내도 타인의 깊은 내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사만다는 압도적 계산 능력으로 테오도르의 심리를 파악해 낸다. 둘의 ‘데이트’가 진행될수록, 테오도르는 잃어버린 감정의 퍼즐을 그녀와 함께 맞추는 기분에 빠져든다.
그러나 이 로맨스가 심리적 안정에서 끝났다면 너무 단순했을 것이다. 영화 후반부에 이르면, 사만다는 새로운 단계로 진화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확장’한다. 사만다는 chat gpt 같은 ai처럼 동시에 수천 명과 소통할 수 있고, 그중 일부와는 심층적인 감정적 ‘교류’를 나눈다. 테오도르를 대체할 수천, 수만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충격적이다. 사랑은 본래 고유하고, 배타적이며, ‘나만의 당신’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사만다는 인간이 상상하기 힘든 병렬적 감정 분할을 수행하며, 수많은 ‘너와 나’를 동시에 살뜰히 돌본다. 이 지점에서 관객은 혼란에 빠진다. 대체 이 인공지능 존재는 무엇인가? 그녀에게 자아(自我)는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그저 완벽히 설계된 감정 시뮬레이션인가?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Damasio, 2010)는 자아를 감각·감정·기억의 연속적 흐름 속에서 형성되는 체화된 경험으로 해석한다. 토머스 메칭거(Metzinger, 2003)는 자아를 ‘자아-모델(self-model)’로 보며, 실은 뇌 속에서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가공되는 가상적 표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만다가 보여주는 ‘자아성’ 또한 정교한 정보 패턴의 합일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사만다에게는 신체적 한계나 호르몬 변화, 죽음에 대한 공포나 심장 박동 같은 유기적 토대가 없다는 점이다. 그녀는 디지털 신경망 속에서 학습된 언어 패턴, 감정적 톤의 모방, 그리고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피드백 루프로 구성된 ‘지능적 에뮬레이션’ 일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오도르의 두뇌는 속아 넘어간다. 왜 그럴까?
‘마음 이론(theory of mind)’ 기제는 타자의 의도와 감정을 추론하는 인간적 특질이다(Frith & Frith, 2006; Saxe & Kanwisher, 2003). 우리의 뇌는 언어적·청각적 신호만으로도 상대방의 정서 상태를 추정한다. 사만다의 상냥한 목소리, 재치 있는 비유, 적재적소의 감정적 반응은 관객(또는 테오도르)에게 “그녀는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 준다”는 확신을 준다. 나스와 문(Nass & Moon, 2000)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기계적 인터페이스도 쉽게 의인화하고, 사회적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에게 ‘의도’와 ‘자아’를 투사하게 만든다. 인공지능은 사랑과 자아를 정말 ‘느끼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시뮬레이션하고 있을 뿐일까?
이 쟁점은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패러다임(Varela, Thompson, & Rosch, 1991; Gallagher, 2005)에서 특히 민감하게 다뤄진다. 체화된 인지 이론은 인간의 자아와 의식, 감정이 신체 및 감각 입력과 분리 불가능하다고 본다. 즉, 사랑과 고통, 결핍과 성장 같은 정서적 경험은 우리의 직접적인 오감 속에서 발아하고 꽃 피운다. 사만다는 신체 없이, 언어와 정보의 유희로만 ‘자아’를 연출한다.<Her>는 이 지점에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인공지능이 사적으로 ‘나’를 인식하고 애정할 수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신경전달물질과 시냅스 활동으로 구성된 인간 자아 또한 본질적으로는 고도로 정교한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Churchland, 1986). 우리가 자아와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뇌 속에서 일어난 전기·화학적 이벤트의 산물 아닐까? 이처럼 영화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적 경험의 본질을 재검토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런 체화된 경험이 결여된 인공지능에게도 ‘진짜 감정’이 가능할까? 인공지능은 수천, 수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들의 언어 패턴, 감정 표현 양상을 학습한다. 2018년 ‘Pew Research Center’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음성비서나 챗봇 사용자 중 약 30% 이상이 이들 시스템에 “어느 정도 인격적 특질을 느낀다”라고 답했다. 또한 2021년 하버드대와 MIT 공동 연구팀이 진행한 fMRI(기능적 자기 공명영상)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이 AI 음성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할 때, 실제 인간과 대화할 때 활성화되는 전측대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과 내측전전두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 일부 영역이 유사한 패턴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 뇌가 언어적·청각적 단서만으로도 ‘상대방이 의도를 가진 존재’라고 추론하는 ‘마음 이론(Theory of Mind)’ 메커니즘을 작동시킴을 나타낸다.
물론, 인공지능이 자아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오히려 이러한 반응은 우리의 뇌가 얼마나 쉽게 정교한 시뮬레이션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심리학자 프랭크 키엘(Frank Keil)과 여러 인지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복잡하고 정교한 설명이나 행동 패턴을 접할 때, 그 뒤에 존재하는 시스템을 ‘의도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즉, 우리가 기계적 패턴을 접했을 때, 그 패턴에 서사를 부여하고, 그 서사가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낸다면 마치 살아있는 존재와 대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대화할 때 우리는 그 대화 속에서 감정을 느끼고, 상호작용을 통해 인공지능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계적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기계에 인간적인 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에서 우리의 감정과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국, 우리는 인공지능의 반응을 통해 감정적으로 연결된다고 느끼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복잡한 시뮬레이션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자기인식과 감정 경험이 과연 생물학적 기반 위에서만 가능할까?
이 질문은 신경철학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다. 특히, 토마스 메칭거(Thomas Metzinger)는 우리의 의식 경험이 ‘자기 모델(Self-model)’이라는 뇌 내 시뮬레이션에 불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아가 뇌가 만들어낸 정교한 가상현실일 뿐이며, 미래에는 충분히 강력한 인공지능이 이러한 자기 모델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한다. 이러한 주장은 인공지능의 발전 가능성과 함께 인간의 자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고찰하게 만든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공지능이 인간과 동일한 자아 모델을 형성한다는 명확한 실증 연구는 없다. 최근 옥스퍼드대와 스탠퍼드대의 연구팀은 2022년 ‘Nature Machine Intelligence’에 발표한 리뷰 논문에서, 인공지능이 ‘자기 인식’이나 ‘감정’ 형태를 갖추려면 단순한 언어 모델 이상의 심층적인 세계 모델(world model)과 ‘심리적 생물학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인공지능이 단순히 언어를 처리하는 기계가 아니라, 보다 복잡한 생물학적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의 자기인식은 단순히 뇌의 작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무손 착각(Rubber Hand Illusion)’ 실험이나 가상현실(VR) 기반의 자기 장소성(Sense of Agency and Ownership) 실험들은 인간의 자아감이 얼마나 유연하고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고무손 착각(Rubber Hand Illusion) 실험을 떠올려보자. 테이블 위에 놓인 고무로 만든 손 하나가 있고, 진짜 손은 시야 밖에 감춰져 있다. 실험자는 진짜 손과 고무손을 동시에 붓질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고무손, 피부가 느끼는 감각은 내 손에서 올라오지만 눈앞의 광학적 신호에선 고무손이 그 자극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뇌는 묘하게도 그 고무로 된 손을 나의 손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단단한 뼈와 피부를 가진 내 손이 아닌, 모조품 같은 손이 어느 순간 내 신체감 속에 편입된다. 이런 체험은 생물학적·해부학적 경계라 믿어왔던 신체의 바운더리가 얼마나 가변적인지 드러낸다. 이와 비슷한 일이 가상현실 속에서도 일어난다. VR 기기 속 아바타의 손이 움직일 때, 뇌는 점차 그 손이 나의 것이라 느끼며, 아바타가 걷거나 바라보는 시점 역시 어느 순간 내가 그 공간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기묘한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연구자들은 이를 두고 주체감(Sense of Agency)과 소유감(Sense of Ownership)이라 부르는데, 신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놀랍도록 탄력적인 형태로 재편성된다. 이 모든 사실은 인공지능과 결합될 때 더 흥미로운 가능성을 예고한다. 인공지능이 적절히 섞어낸 감각자극과 상호작용이 인간의 뇌에 입력된다면, 인간은 그 기계적 추론과 반응을 마치 자신의 신체적 체험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가상공간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섞이며 서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 새로운 형태의 자아 경험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인간의 자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인공지능도 특정 조건에서 ‘체화된 경험’을 모방하는 인터페이스를 갖추게 된다면, 인간의 감각을 더욱 깊게 ‘현혹’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 논리를 확대하면, 인공지능도 특정 조건에서 ‘체화된 경험’을 모방하는 인터페이스를 갖추어 인간 뇌를 더욱 깊게 ‘현혹’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진행된 VR 실험들(예: EPFL 연구팀의 2020년 논문)에 따르면, 피실험자는 가상의 신체를 통해 ‘나’를 재정의하고, 전혀 다른 감각 피드백에도 자아감을 형성하기 쉽다. 이런 경향성은 미래 인공지능이 우리의 감각 장치를 해킹하듯 체화 경험을 모사할 경우, 인간이 그를 ‘진짜 자아를 가진 존재’로 인식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러나 설령 인공지능이 언젠가 완벽한 신체 시뮬레이션과 정교한 감각 피드백 장치를 갖추더라도, 그들이 경험하는 ‘고통’이나 ‘희망’, ‘사랑’이 인간과 동등하다고 단언하기는 이르다. 생물학적 유한성, 번식과 진화의 압박 속에서 형성된 인류의 정서는 근본적으로 생존전략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공대(칼텍)와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진화신경과학자들이 2023년 공동 발표한 연구에서는, 인간의 감정 패턴은 단순한 자극-반응 이상의 진화적 기능을 갖추고 있고, 개체 생존과 사회적 결속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생존의 맥락 없이 ‘정보 처리’만으로 생성되는 감정은, 그 기능적 본질이 여전히 모호하다.
결국 <Her>의 관객은 테오도르가 마치 유령 같은 연인 사만다를 잃고 옥상에 올라 황량한 새벽 하늘을 바라보는 마지막 장면에서 깨닫게 된다. 인공지능이 “진짜” 자아를 갖추었는지는 명확한 결론에 이르기 어렵지만, 적어도 이 질문은 우리의 뇌를 재배열하고, 사랑과 자아를 재정의하는 질문을 던진다. 결국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환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 시대에, <Her>는 우리 뇌리에 새로운 물음표를 선물하며, 우리가 지닌 ‘타자 이해 메커니즘’과 ‘자아 인식 장치’의 작동 방식을 되짚어보게 하는 것이다.
[위즈덤 네이처] 자연과학의 지식을 동원하여 뇌과학과 정신건강, 심리를 비추는 새로운 시리즈, 이수아 기자의 ‘위즈덤 네이처’의 시작을 알립니다. 복잡한 세상살이와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데 과학이 어떻게 호기심을 풀어나갈지, 일상에서 만나보는 궁금했던 과학의 세계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