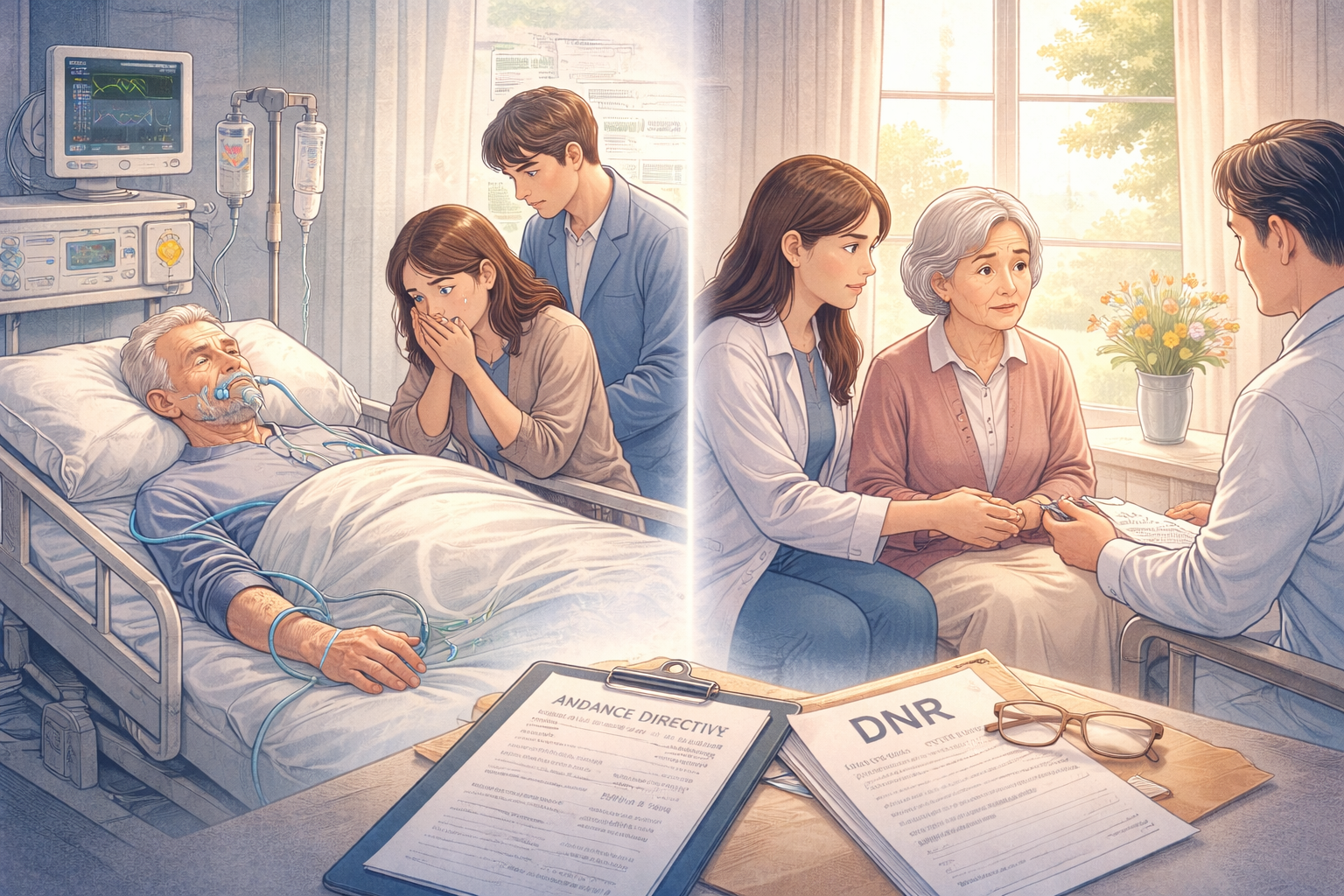[ 객원 에디터 6기 / 함예은 기자 ] 한 번쯤 ‘문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단어는 ‘문화’와 ‘찐따’라는 단어를 합친 신조어로, 최근 유행이나 대중문화에 뒤처진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유행을 따라가는 것을 중요시 여기며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소외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유행이 퍼지는 속도나 그 유행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엄청나다.
패션 아이템이 소셜 미디어나 방송의 노출을 통해 유행하기 시작하면, 길거리에서 같은 아이템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인증숏을 위해서라면 인적이 드물거나 먼 곳이라도 거리낌 없이 찾아간다. 오직 유행에 편승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렇게 유행에 따라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 현상을 ‘밴드웨건 효과’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유행에 동조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되지 않고 싶어 하는 심리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유독 다른 사람과의 관계, 시선을 신경 쓰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대세를 따름으로써 소외되지 않는다는 안정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심리 현상은 소셜미디어가 더욱 발달하면서 확장되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 소셜미디어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유행 상품이 노출된다”라고 전했다. 방송과 미디어는 고객의 감성을 자극한 광고를 통해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수요를 촉진한다. 고객들은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자신이 유행에 뒤처진다고 생각하게 된다.
실제로 휴먼클라우드 플랫폼 뉴워커가 성인 남녀 833명을 대상으로 유행에 민감한지 묻자, 10명 중 6명이 민감하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유행에 예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무조건 유행을 따르는 것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행 상품이 나올 때마다 구매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등 각종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행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타인과의 비교, 과소비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2000년대 초반에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던 고가 패딩이 있었다. 수십 만 원을 호가하는 패딩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그들에게는 고등학생의 필수품이 되었다. 이 때문에 특정한 패딩을 입지 않으면 무시를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런 유행의 시작은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쉽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였다. 학생들은 이런 소외감을 벗어나기 위해 부모님들에게 고가의 패딩을 요구했고, 부모에게 과한 요구를 하여 등골을 휘게 하는 학생들을 일컫는 ‘등골 브레이커’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문화평론가 박성준은 “한국은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대신 집단에 어울리기 위해 유행에 편승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일이 많다. 이것이 반복되면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오히려 새롭게 등장하는 유행에 쫓겨버리는 악순환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개성이란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이다. 개성이 있는 사회는 다양한 선호와 관습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는 것에만 집중해 개개인의 개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개성을 잃지 않으려는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유행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내고 남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