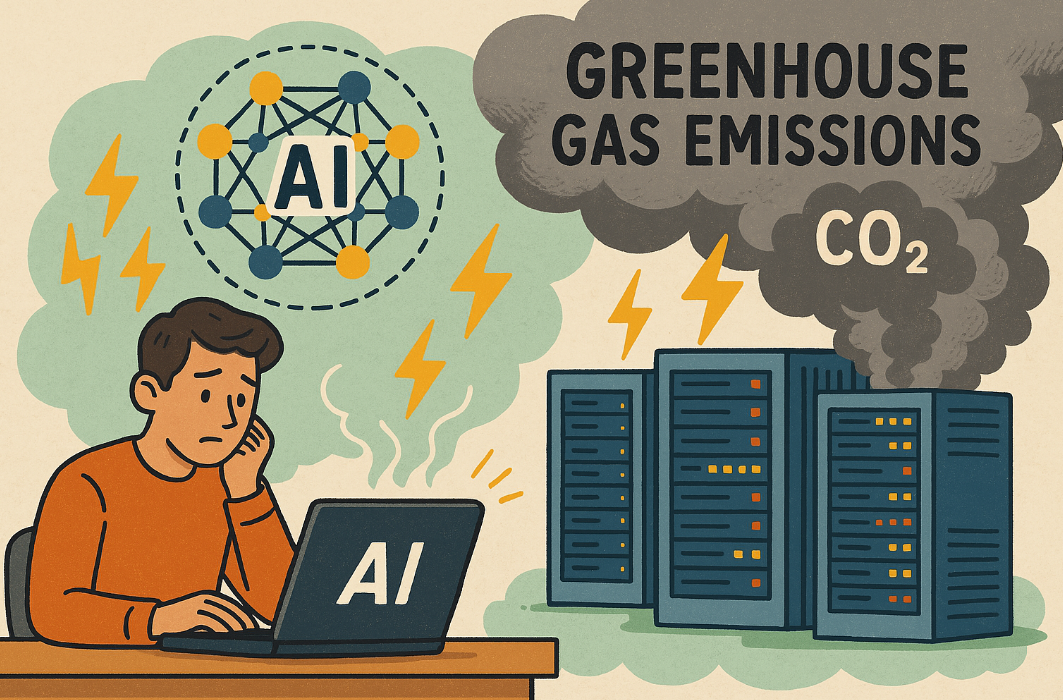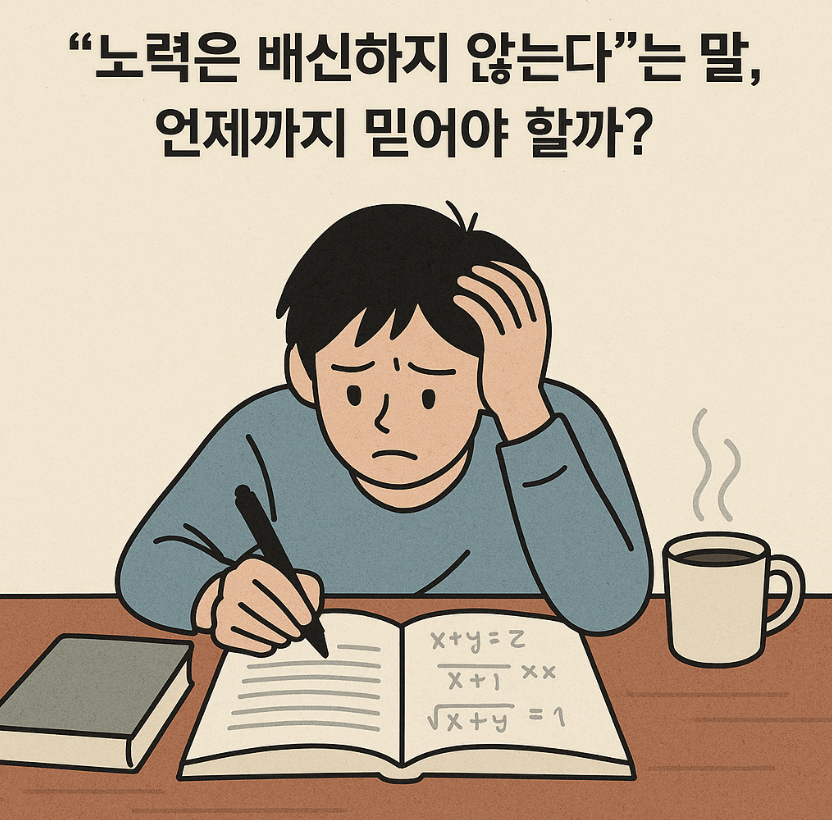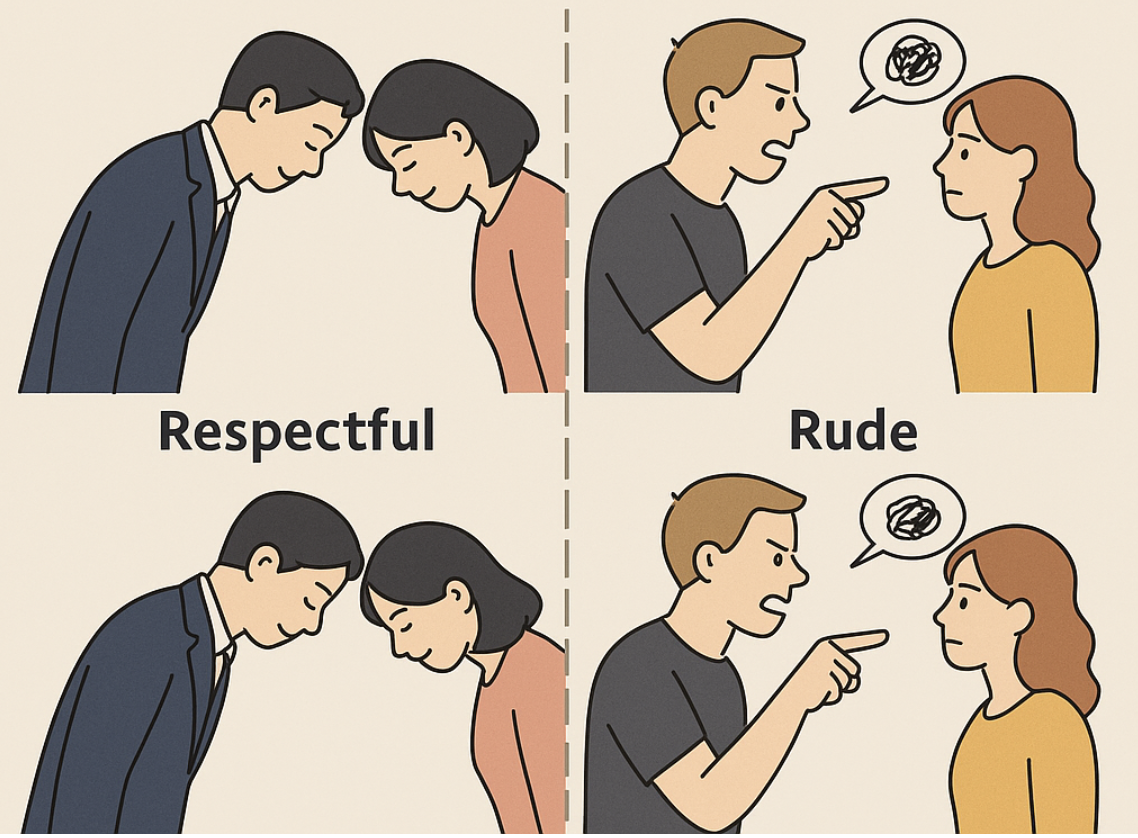< 일러스트 OpenAI의 DALL·E 제공 >
“대화 한 번에 생수 반병이 사라진다” 생성형 AI의 환경적 대가
[객원 에디터 9기 / 정한나 기자]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그 이면에 숨겨진 환경 비용이 주목받고 있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와 같은 대화형 AI는 심화된 계산 능력을 보여주지만 막대한 전력을 요구하며, 그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 AI는 단순히 가상의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탄소 배출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
스탠퍼드대학교의 ‘AI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를 훈련하는 데만 약 502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는 한 사람이 100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다. 또한, 챗GPT를 20~50회 사용할 때마다 약 500ml의 물이 냉각용으로 소모되며, 이 물은 AI 서버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 전력 소비 측면에서도, 챗GPT는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 검색보다 10배에 가까운 전력을 소비한다.
AI로 생성되는 이미지 역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허깅페이스와 카네기멜론 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한 장의 이미지를 생성할 때마다 휘발유 차량이 약 6.1km를 주행하는 것과 동일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AI가 생성하는 콘텐츠의 환경 비용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6년까지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일본 전체 전력 소비량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조업체들보다 더 많아졌으며, 그들의 환경적 책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는 1,536만 톤, 구글은 1,43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보고했다. 국내 기업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네이버는 한 해에 8만 9,505톤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으며,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배출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배출의 주요 원인은 데이터센터 운영과 인공지능 사업 확장이다.
메타와 아마존 등 일부 기업들은 탄소 중립(Net-Zero)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배출량은 발표된 수치와 차이를 보인다. 메타는 2022년 273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수치는 390만 톤에 달했다. 이는 기업이 시행한 친환경 에너지 투자가 탄소 배출을 줄인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에서 발생한 차이로, 기업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LA타임스는 AI가 기후 위기 대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 소비를 줄이는 방안을 찾고, 사용자들에게 AI 기능 사용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이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탄소 배출 감축 노력과 AI 기술의 지속 가능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생성형 AI 기술의 진보가 환경 파괴를 동반한다면, 그것은 균형 잡힌 진보가 아니라 왜곡된 발전일 수 있다. AI 사용이 점차 확산함에 따라,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조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또한, 사용자들은 AI 기술을 사용할 때 그로 인한 에너지 소비와 환경적 영향을 인식하고, 필요 이상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AI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모두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