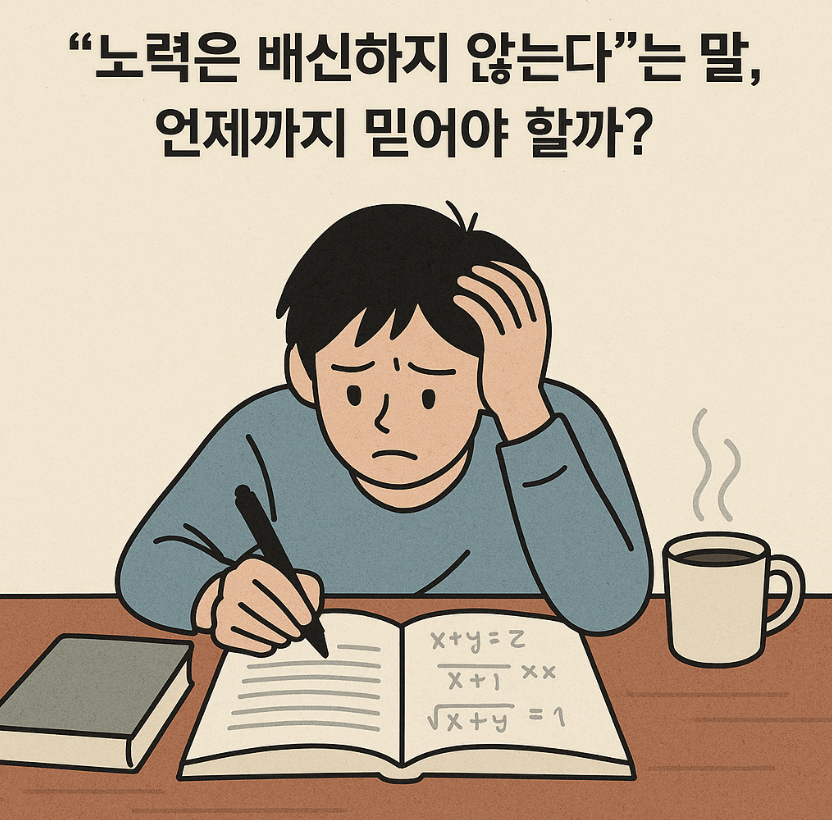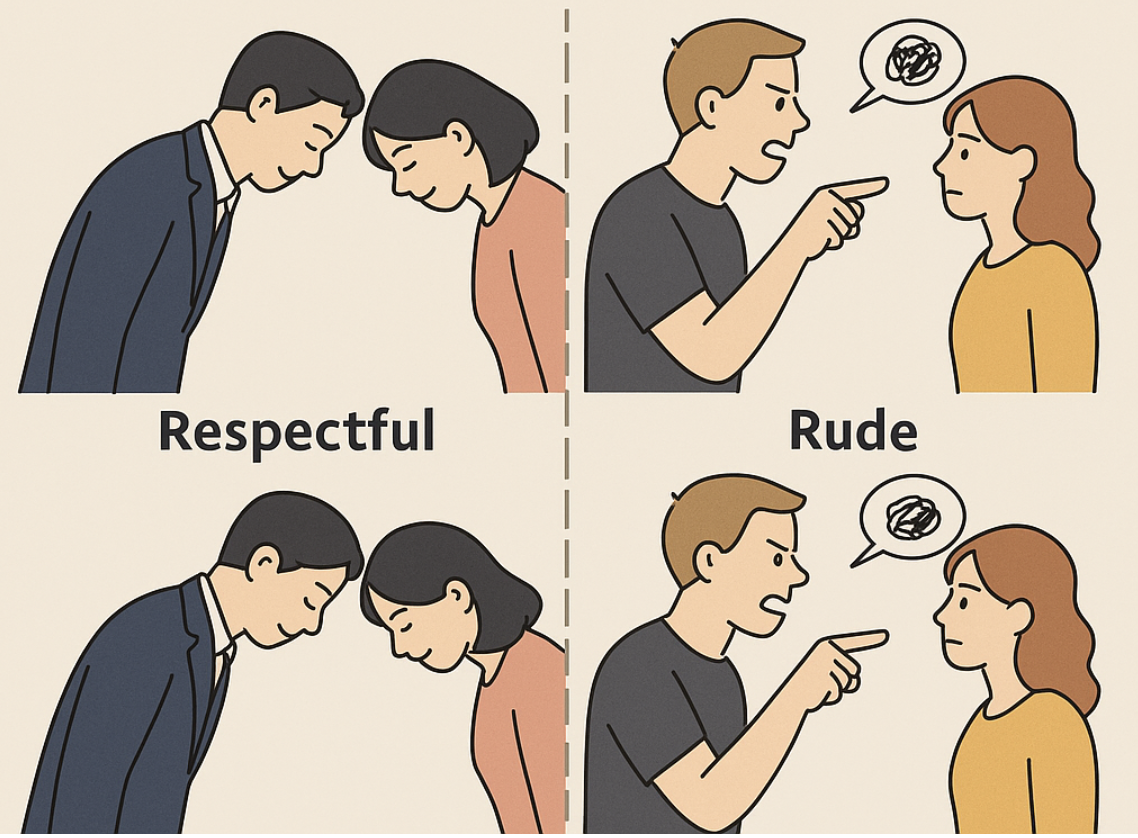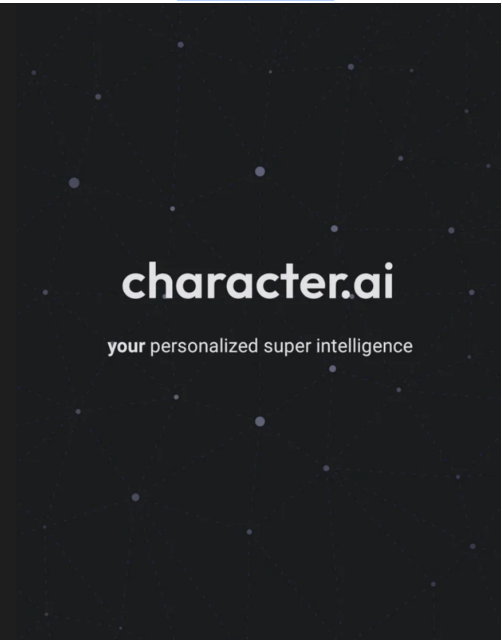[객원 에디터 7기 / 이지윤 기자]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 문제이다. 출산율이 0.78명으로 하락했다는 뉴스나 온라인 기사를 한 번쯤 접해본 사람도 많을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언론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일부에서는 ‘저출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차별적인 어감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한 단체는 여성가족재단이다. 2018년에 발표된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꾼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 사전” 보도자료에서 여성가족재단은 ‘저출산’이라는 단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신 ‘저출생’이라는 단어 사용을 권장했다. 그렇다면 저출산과 저출생이라는 두 단어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저출산의 ‘낳을 산(産)’은 아기를 낳는 산모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여성에게 돌리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저출생의 ‘생(生)’은 태어나는 아기를 주체로 하여 인구 감소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 돌리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덜하다. 정연정 서울시성가족단 대표는 “저출산이란 용어는 자녀의 탄생과 양육의 주체가 출산자인 여성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며 “생명의 탄생과 성장은 엄마와 아빠, 사회 모두의 협력으로 가능하기에 저출생이 적합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법률 용어와 정부의 공식 용어는 모두 저출산이다. 관련 법령인 ‘저출산·고령사회의 기본법’에서는 저출산이라는 단어만 사용되며, 관련 정부기관의 명칭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인구 감소 문제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의 문제점이 분명해지자, 국회는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확하고 평등한 의미를 담은 단어 사용을 장려하는 것은 긍정적인 시도지만, 출산과 출생 자체는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단어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많은 사람들이 출산율과 출생률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이 두 단어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언론에서 기자들이 출산율에 대해 언급할 때 대부분 합계출산율을 의미한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을 기준으로 출생아 수를 예측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 또한, 합계출산율은 주로 국가별 출산율을 비교하거나 인구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다.
반면 출생률은 특정 집단에서 인구 1000명을 기준으로 태어난 실제 출생아 수를 의미하며, 이는 아이들이 얼마나 태어났는지를 예측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새로 태어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왜 요즘 많은 여성이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출산에 집중해야 하고, 특정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출생에 집중해야 한다. 저출산과 저출생은 이렇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상황에 따라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저출산은 저출산으로, 저출생은 저출생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