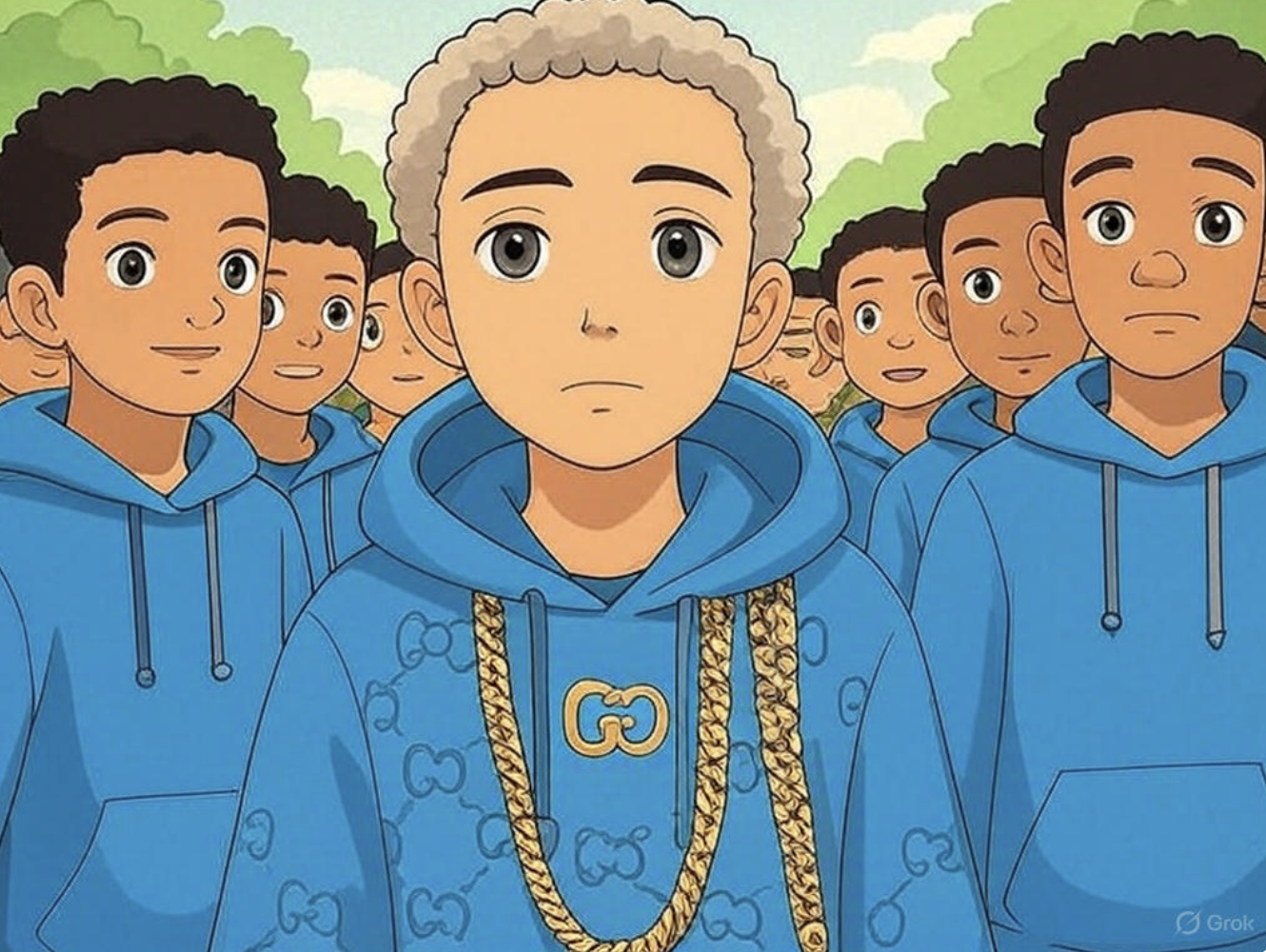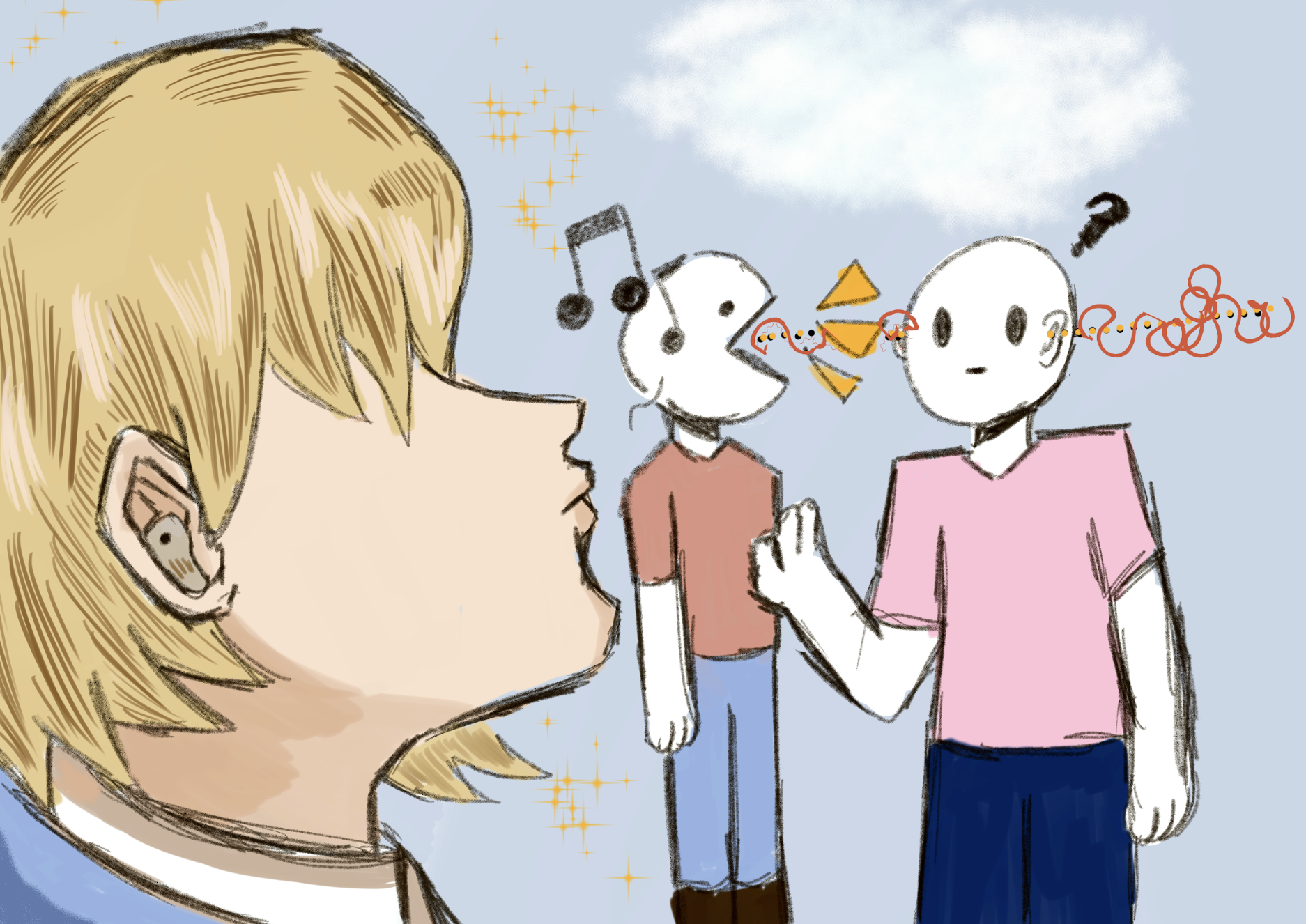< 일러스트 Grok3 제공 >
[위즈덤 아고라 / 오민경 기자] 우리 모두, 한두 가지쯤은 스스로가 참 못마땅한 면이 있다. 매사에 통제를 놓지 못하는 성향,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기감정을 억누르는 태도, 감정이 깊어지면 사람을 밀어내는 습관,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 혹은 관계가 복잡해질 때 곧장 “잠수”타는 행동들. 흔히 이런 것들을 “독하다”, “문제 있다”라고 부르지만, 어쩌면 그것들은 결함이 아니라 방어기제가 성격처럼 굳어진 결과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독한 성격”은 트라우마가 교묘하게 위장한 모습인 셈이다.
우리가 흔히 ‘독하다’고 말하는 행동 중 상당수는 사실 생존을 위한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들은 무의미하게 생긴 게 아니라, 삶의 경험 속에서 몸에 밴 반응들이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는 통제가 불가능했던 환경에서 자라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조절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행동뿐이었기에, 그 통제가 곧 자신의 ‘안전빵’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아마도 자라온 환경에서 감정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조차 배울 기회가 없었을 수 있다.
슬픔은 “오버한다”는 말로 무시당하고, 분노는 “버릇없다”며 억눌렸을지 모른다.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결국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조차 잊게 된다. 만약 감정을 읽고 표현하는 능력을 수학이나 과학처럼 배울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우리는 흔하게 “잠수”를 타거나 분노로 굳어지기 전에, 더 쉽게 마음을 말로 풀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습관은 과거에 가까웠던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기억에서 비롯된 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는 감정을 닫는 것이 곧 ‘자기 보호’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신경 쓰며 갈등을 피하려는 태도 역시, 일종의 트라우마 반응이다. 이를 ‘fawning’이라고 부르는데, 생존을 위해 자신을 작게 만들고, 사랑받기 위해 늘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방식이다.
겉으로 보기엔 이런 행동들이 “성격적 결함”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들은 모두 과거의 위험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다만 그 위험이 사라진 지금에도, 마치 낡은 소프트웨어처럼 여전히 몸속 어딘가에서 예전의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이다.
트라우마는 뇌 구조에도 영향을 주는데 특히 성장기일수록 그 영향은 더 크다.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체가 예민해지고, 뇌는 고통을 피하기 위한 특정한 패턴을 반복 학습한다. 문제는 그 위협이 사라진 후에도 뇌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점이다.
2011년 12월,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Eamon McCrory 박사 연구팀은 학대받은 아동들이 화난 얼굴과 같은 위협적인 자극을 볼 때, 편도체와 관련된 뇌 영역의 활성도가 높아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학술지 Current Biology에 발표했다. 이는 전쟁터에 노출된 군인들과 유사한 반응으로, 위협이 사라진 후에도 뇌가 여전히 과도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2014년 NeuroImage 학술지에 발표된 Martin H. Teicher 박사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10~11세 시기에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성인이 되었을 때 오른쪽 편도체의 부피가 약 9%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이 시기가 편도체 발달에 있어 민감한 시기임을 나타내며, 이 시기의 스트레스가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뇌의 변화가 단기적으로는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 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성향을 ‘독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버린다. 그렇게 성격은 고정되고, 정체성이 되어버린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는 결론으로 닫혀버린다. 하지만 그 행동이 사실은 상처에 대한 반응이고, 경험이 만들어낸 생존 방식이라는 걸 인식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 순간, 마침표는 쉼표가 되고, 질문이 생긴다.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
이 질문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기 이해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해가 생기면 연민이 생기고, 연민이 생기면 변화가 가능해진다.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트라우마의 흔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비난 대신 치유가 시작된다. 이건 행동을 변명하거나 정당화하자는 말이 아니다. 행동의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그 이야기의 결말을 새롭게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안의 ‘독한 면’을 지워버리려 하기보다는, 그 아래 어떤 상처가 숨어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할 때다. 진짜 변화는 “내가 왜 이래?”가 아니라, “내가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